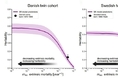![진열된 옷. 사진은 기사와 직업 관련이 없음. [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522/art_17484716193688_7dad04.jpg)
옷을 만들어 입고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아우름비즈에서 이랜드월드 등 의류업체 5곳과 재활용업체 6곳 등 21곳이 참여하는 '의류 환경 협의체'가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의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협의하며 의류 생산·유통·재활용·폐기 전(全)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관리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옷을 만들어 입고 버리는 과정에서도 여느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원이 소비되며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다.
유엔 '지속가능한 의류 연합'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8∼10%가 의류산업에서 발생했다.
의류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2030년 12억4천3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2022년·7억2천430만t)의 1.7배에 달한다.
전국 폐기물 발생량 통계를 보면 2023년 폐의류 발생량은 11만938t으로, 4년 전인 2019년(5만9천t)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심지어 이 수치는 생활폐기물로 분리배출이 이뤄진 폐의류만 셈한 것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의류는 2023년 2천490.5t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태선 의원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71개 의류업체가 5년 동안 배출한 폐의류·폐합성섬유·폐합성수지류와 그 밖의 폐섬유가 214만2천57t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패스트패션'이 트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옷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각국이 재고품 폐기 금지, 친환경 디자인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입, 수선 가능성과 내구성 등 환경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