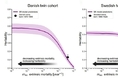![[서울아산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729/art_17529820190112_6247f8.jpg?iqs=0.8843607903380125)
"○○○님 어제는 많이 못 주무셨다고 하셨죠? 제가 오늘 밤에 잘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리를 정리해 드리고 곧 불도 꺼 드릴게요. 만약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게요."
야간 근무에 나선 서울아산병원 국서라 간호사는 인공호흡기와 연결된 관을 통해 새빨간 피를 토해내는 폐암 환자에게 힘찬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길고 긴 사투를 벌여야 했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모니터는 연신 위험하다는 알람을 울려댔고 국 간호사의 지극한 간호에도 환자는 침대 시트를 흠뻑 적실 만큼 땀을 흘렸다.
결국 의사는 환자에게 가망이 없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칠 대로 지친 환자는 '수면제', '안락사', '편하게 죽고 싶어요'라는 글을 힘겹게 적어 간호사에게 전했다.
국 간호사는 '그래도 가족은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환자를 다독였다. 땀과 피로 얼룩진 환자복도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마침내 가족들이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가족들이 보지 못하도록 '안락사'라고 쓰인 종이를 버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면회를 하고는 편안한 얼굴로 긴 잠자리에 들었다.
국 간호사는 "간호사는 보름달이 차오르듯 환자에게 희망과 밝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생의 끝자락에서 가슴 뭉클한 그믐 또한 함께 감내해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라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부가 펴낸 신간 '오늘도 간호사입니다'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환자와 간호사들이 나눈 정(情)이 빼곡히 담겨있다.
박영아 간호사는 새벽 3시 반, '묻지마 범죄'로 경동맥이 손상돼 너무 일찍 세상을 등진 17세 소녀의 머리를 감기고 정성스레 말렸다.
긴 머리가 흥건한 피에 뒤엉킨 채 굳어버린 처참한 모습으로 소녀를 가족에게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박 간호사는 그것이 '지금 해야 할 간호, 아니 하고 싶은 간호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반복되는 죽음, 힘든 업무 강도, 환자와 보호자가 때때로 쏟아내는 상처 되는 말들은 간호사들을 무디게 하기도 한다.
아무도 우리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자책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다.
그래도 환자와 보호자의 삶에 변화를 만들었던 순간에 대한 기억, 환자들이 건넨 감사 편지는 자신을 추스르게 한다고 간호사들은 말했다.
기관절개술을 앞둔 루게릭병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녹음해 두는 게 어떠냐고 권하고, 1인 중환자실에 혼자 남겨진 또래 환자가 무섭지 않게 손을 꼭 잡아주는 일은 간호사들이 진심으로 환자의 아픔에 공감했기에 가능했다.
김명숙 간호부원장은 "간호는 단지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만이 아니라 아픔을 살피고 마음을 헤아리며 환자가 자기 삶을 끝까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을 돌보는 이들의 진심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군자출판사. 22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