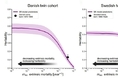![윤남희씨 가족사진 [본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www.hmj2k.com/data/photos/20210101/art_16097223358937_4fe1ac.jpg)
"제게 가족이란 `가장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사람과 구성해야 하고, 형태와 상관없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곽이경(42)씨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한 빌라에서 5년째 함께 사는 동성 배우자와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털어놓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간 혼인이 인정되지 않아 혼인신고는 할 수 없는 사이지만, 이들은 상대방 부모·형제와도 왕래하고 각종 대소사를 챙기며 자연스럽게 생활을 공유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관계에 완전히 편입됐다고 느꼈다"는 게 곽씨의 설명이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가족이고 부부인데도 이성 부부 가족과는 달리 법적·제도적 보호에서 제외된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신혼부부용 주택지원 제도는 쳐다보지도 못했고, 질병보험의 수혜자를 배우자로 바꾸려고 하자 "보험사기 아니냐"는 의심부터 받았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국가가 인정하고 보호하는 울타리 밖에 있어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기 일쑤다. 분명히 한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식구'(食口) 임에도 일상 속 많은 순간 `법적 가족'이라는 벽에 부딪혀 좌절해 왔다.
"우리는 조금 특이한 가족"이라며 구성원을 소개한 윤남희(55)씨도 이른바 '정상가족' 범주를 벗어난 가족을 꾸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윤씨와 남편의 집에는 6개의 성(姓)을 가진 7명의 식구가 산다. 장성한 친자식들은 이미 독립해 나갔고, 대신 8년째 위탁받아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있다. 2년 전부터는 국내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 출신 여성과 그가 서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도 윤씨네와 함께 살며 한솥밥을 먹는다.
이들은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어느덧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한 식구가 됐다. 하지만 위탁부모는 친권이 부여되지 않는 `동거인'에 불과해 쌍둥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윤씨는 "아이들에게 첫 휴대전화를 사 주려 했는데 내가 법적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개통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더라"며 "가족관계 증명이 되지 않아 은행도 마음대로 못 갔다"고 말했다.
그는 "다쳐서 수술받을 때조차 보호자란에 내 이름을 써넣을 수 없다고 한다"며 "항상 아이들에게 '미성년자일 땐 엄마가 못 해주는 게 많으니 너희가 빨리 커야 한다'고 강조하는 현실이 참 씁쓸하다"고 했다.
위탁관계조차 아닌 캄보디아 여성 모녀와 함께 사는 것을 두고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고 한다.
윤씨는 "식구들 덕분에 온기가 있는 집이 됐는데 주변에서는 '왜 가족도 아닌 사람들과 그렇게 사냐'며 많이들 뭐라고 한다"며 "세상의 차별적 시선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윤씨는 "불편한 점보다 행복한 순간이 더 많은 가족"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자신의 가족이 단순 동거인으로만 취급받는 현실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위탁 기간만이라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위탁 아동들도 가정에 소속감을 느끼며 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춘기조차 눈치 살피며 겪어야 하는 위탁 아동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곽이경씨도 "지금은 이성 부부만 인정되는 결혼제도에 동성 부부도 포함할 뿐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개인의 결합을 폭넓게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